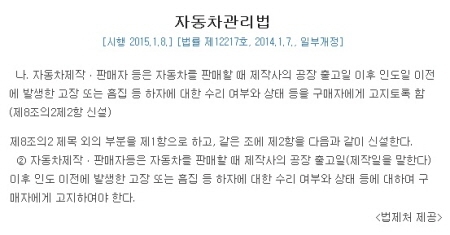
지난 1월7일 공표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중 수입차 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용은 ‘제8조의2제2항(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 이후 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토록 함)’이다.
해당 법안은 차량 인도 전 발생한 고장 및 수리 등과 관련해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신설됐다. 국회는 자동차 판매 전 발생한 하자 및 수리 여부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개정안을 의결했고,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8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수입차 업계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세부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공장 출고일’ 기준은?
먼저, 수입차 업계는 공장 출고일을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산차와 수입차를 동일선상에 두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국산차는 공장 출하일을, 수입차는 PDI(Pre-Delivery Inspection) 센터 출고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입차에게 필수불가결한 해상 운송은 사실상 제조 과정의 한 부분으로 봐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생산 및 조립 공정 후 제품 검수를 마쳤을 때 비로서 제품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면, PDI 업무는 최종 검수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독일차 관계자는 “전 세계 어느 시장에서나 생산 공정의 마지막 단계는 PDI 작업으로 보고 있다”며 “공장마다 출고센터가 있는 국산차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입차 업계의 요청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측에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입 과정을 포함한 자동차 제작 및 운송과정 전반에 발생한 고장 및 수리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난해 밝혔기 때문이다.
한 일본차 관계자는 “급성장하고 있는 수입차를 견제하기 위한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장벽”이라고 우려했다.
◆ 어디까지 공개하나?
수입차 업체 관계자들은 “소비자들에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알려야 하나”라며 “장기간 운송 과정에서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부터 기능 점검에서 발견된 램프 고장과 같이 사소한 소모품 교체도 알려야 하는가”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특히 PDI 센터에서 다양한 편의 및 안전 사양을 추가 장착하는 업체들은 무척이나 곤란한 입장이다.
네비게이션이나 후방 경고 센서 등을 장착하기 위해서 대쉬보드나 범퍼 등을 탈부착해야 한다. 고급 가죽 시트와 같은 옵션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맞게 기존 시트를 떼어내고 교체하는 일이 다반사다. 한국어 업데이트와 같은 소프트웨어 작업은 물론, 일부 안전 및 소음 기준을 통과하기 위한 일련의 추가 작업까지 수리 정비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일부 수입차 PDI 센터 관계자들은 “간단한 덴트 작업으로 복원되는 미세한 흠집이나 동전 크기 이하의 스크래치 제거 등은 도장 및 판금 수리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일반적인 주행 환경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작은 흠집까지 출고 전 기록하고 문서화할 경우 차후 보험 보상 및 중고차 매매에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수입차 업계에서는 “이미 개정안이 공표된 상황에서 현재 시장의 환경을 반영한 명확하고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